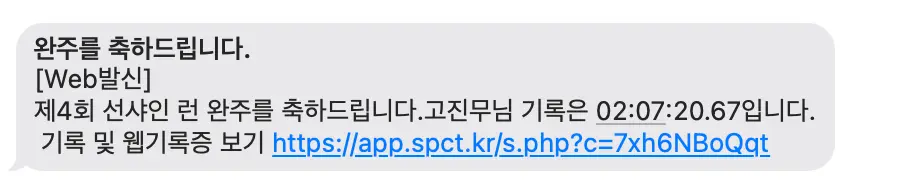지난 8월 30일에 열린 제4회 선샤인 런에 참가했다. 달리기를 시작한 이래로, 처음 공식적으로 뛰어보는 하프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기억에 많이 남았던 마라톤이어서 글로 남겨보려 한다.
우선,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. 글을 읽는 당신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, 대회 당일 2025년 8월 30일의 날씨는 정말 변덕 그 자체였다. 내가 러닝을 하는 2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날씨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모르겠다. 출발할 때는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는데, 뛰는 중간에 해가 떠오르더니 어느샌가 자취를 감추고 다시 비가 오고…. 정말 신기한 날씨였다. 무지개도 뜨고. 다행인 건 나는 비 오는 날뛰는 우중런을 굉장히 좋아한다. 나중에 신발 빨긴 힘들지만, 숨쉬기도 편하고 비에 젖은 나무들이 더 예뻐 보일 때가 있으니까.
마라톤은 잠실 종합운동장 9시에 출발이었고 춘천에서 아침 버스를 타고 출발 지점까지 지하철로 이동했다. 미리 시간 계산을 하고 갔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. 그래서 충분히 몸을 풀지 못하고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. 그 때문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생각보다 더 처지고 무겁게 느껴졌다. 그래도 어쩌겠는가. 이미 레이스는 시작되었다. 다행인 건 이번에는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뛴다는 것이다.
혼자 하프를 뛸 때와 같이 뛸 때의 차이점은 서로서로 보면서 뛴다는 것이다. 레이스 초반에는 생각이 많았다. 다른 사람들의 페이스를 쫓아가 보기도 하고 주법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내가 뛰는 방법과 어떤 게 다를까.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달릴까? 등등….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동시에 나를 봤다.
중반으로 접어들자, 이제는 다른 사람들 생각을 조금 덜 하기 시작했다. 아니,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게 좋겠다. 내가 당장 힘들어서.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지니 다른 사람들을 볼 여력이 없었다. 그렇게 무심히 초록을 지나고 파랑을 넘어 나갔다. 이번 마라톤의 목표는 한 번도 걷지 않는 것이었는데,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다. 마라톤 코스 중간에 있는 꽤 높은 언덕에 한 방 먹고 멈출 수밖에 없었다.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다. 단순한 진리다.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이 한순간 미워졌다. 내리막길도 조절하지 않으면 가다가 지칠 수 있다. 조심해야 한다.
15km 지점을 지나고 나서 점점 몸이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다. 평소대로라면 이 정도 거리를 지나고도 쌩쌩했겠지만, 오늘은 왜인지 달랐다. 특히 오른쪽 정강이 쪽이 쥐가 날듯이 저렸다.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를 반복하며 나아갔다. 뛰다 걸으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한다. 특히 눈에 띄는 주자들이 보인다. 나와 비슷한 또래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중년들 그리고 아이들까지. 절로 겸손해지는 세상이다. 참 넓고 많은 사람이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.
체감상 18km 구간이 가장 힘들었다. 코스를 한 바퀴 돌아 처음 가볍게 지나쳤던 3km 지점을 15km의 간극을 두고 다시 마주했을 때는 싱숭생숭한 기분이었다. 마지막 1km에선 오른쪽 정강이에 쥐가 난 채로 뛰었다. 적어도 2시간 내에는 도착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힘을 낼 수 없어 아쉽게 포기했다. 하프 마라톤은 참 묘한 거리다. 10km보다 분명히 길고, 전 구간보다는 가깝다. 그래서 욕심을 부리기 쉬운 거리이기도 하다. 하프의 매력은 바로 거기에 있다. 내 한계와 욕심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지점. 그날의 컨디션, 날씨, 관중의 응원, 누군가의 발걸음, 내 호흡—모든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. 그렇기에 매번 새로운 레이스가 된다. 언젠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<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>에서 이런 비슷한 구절을 읽은 것 같기도 하다. 매번 똑같은 길을 똑같이 뛰어가고 있더라도 그날의 러닝은 그 어떤 달리기와도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을 것이라고. 내 기억이 완벽하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어떤가.
혹시 지금 첫 하프를 고민하고 있다면, 한번 뛰어보는 걸 권한다.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. 이번 제4회 선샤인 런은 내 러닝 인생에 굵은 줄로 남을 것 같다. 이제 시작이다. 세상의 모든 마라톤을 제패할 때까지 파이팅.